지난 한 달 동안 Yellowstone, Latvia, Norway (Arendal, Oslo, Tromsø)를 다녀 왔다. 응당 3곳 모두 적어야 맞겠지만, 시간 상 인상적이었던 Yellowstone과 Norway에 대해서만 짧게 써보자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서사가 있는 기행문이라기 보다는, 그때 그때 들었던 감흥과 생각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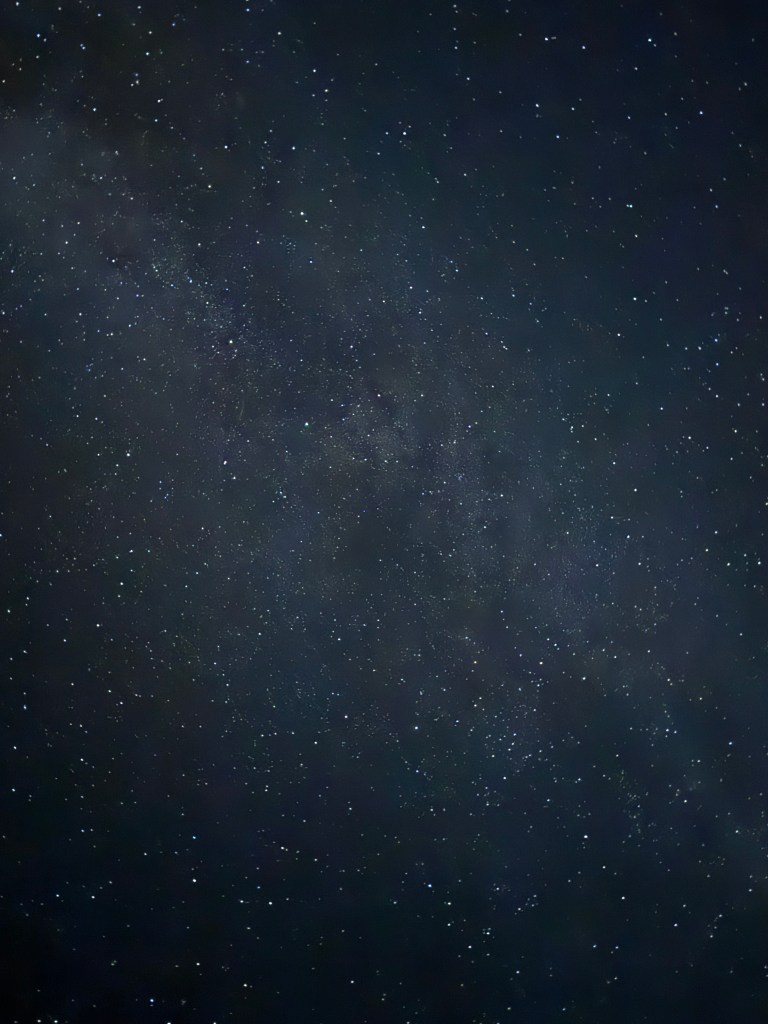

Yellowstone의 이것을 꼭 보러 가야지! 했던 건 아니었다. 무의식중에 언제부터인가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가봐야만 하는 미지의 공간에 가까웠다. 교과서에서 봤던 낯 익은 이름. 미국의 첫 번째 국립공원이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한 몫 했던 것 같다 (최초와 교과서의 힘은 강력하다). 아직도 끊임없이 활동 하고 있는 거대한 활화산 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비행기와 숙소를 다 예약하고 난 다음이였다.
드넓은 호수, 푸르른 평원, 깎아지는 절벽, 울창한 숲, 눈 덮인 봉우리는 그 어떤 국립공원에서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Yellowstone의 특별함은 이 모든 것들이 넘실대는 화산 지형 위에 있고, 그로 인한 형형색색의 연못 (Pool), 간헐천, 끊임없이 분출하는 수증기와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다.
화산 지형이라고 하면 반지의 제왕의 모르도르처럼 죽음만 남아 있는 황폐한 대지를 생각하겠지만, Yellowstone은 오히려 생동감과 다양성을 더 해 더 다채로운 자연을 선물한다. 예로 지열로 인해 막 뿜어져 나온 지하수는 우리 눈 앞에서 강으로, 호수로 바로 흘러 들어가고, 동물들은 또 바로 그 물을 마시고, 수영한다. 강의 수 많은 지류가 흐르는 평원에서 바이슨의 떼가 끝없이 이어지고, 무스와 엘크, 곰과 늑대 무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자연을 보기 위해 망원경과 대포 카메라를 짊어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다닌다. 단순히 스케일에 압도 되기 보다는 자세히, 멀리, 그리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곳이다.
사이즈와 인터넷
공원은 8,983km²의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서울에 비해 무려 14배나 크고, 경기도 전체와 비슷하다), 놀라운 것은 이 드넓은 공원 대부분 데이터가 안 터진다는 사실이다. 어디까지 의도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에 제 격인 곳이다. 기대하지 않은 디톡스를 하게 되며, 재미가 생긴다 (이제 전세계에서 이걸 의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디톡스라는 것은 인터넷의 유해한 영향에 벗어난다의 의미도 있겠지만 디지털 세계에 연결 되지 않은 채, 오롯이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된다. 컴퓨터스럽게 얘기하자면, 더 이상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엄청난 집단 지성의 서버에 연결되지 않은 작은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CPU까지). 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같이 온 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내 머릿 속을 헤집어야 한다. 다음 수를 찾는 알파고처럼.
우리 뇌 속 검색 알고리듬이 어떻든, 우리는 더 이상 인터넷과 핸드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머리라는 하드 드라이브 안에 다운로드 되고 쓰여진 데이터를 찾아 끄집어 내야 한다. 재밌게도 여행 내내 이야기를 한참 각자 쏟아 놓고, 그 날 그 날 나왔던 질문들과 궁금증을 모아 뒀다가, 숙소에 돌아가서 검색하며 무엇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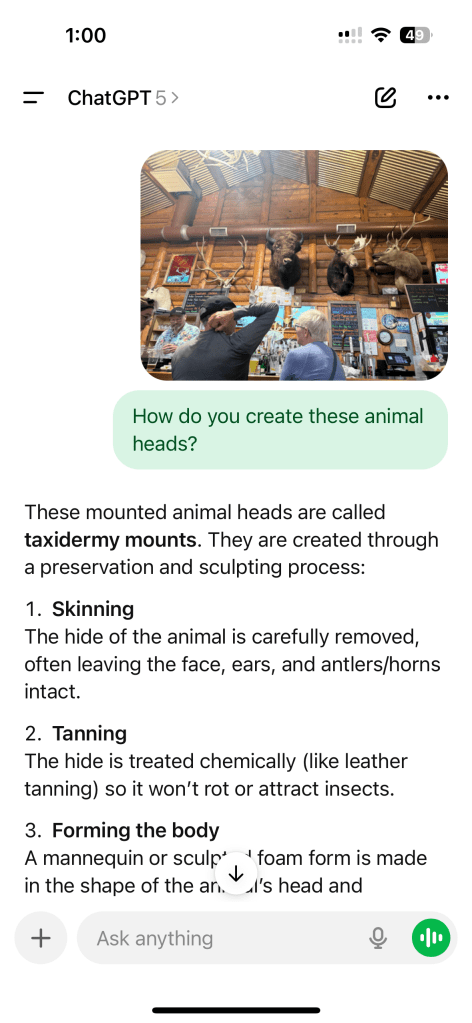
그렇게 보면 검색이라는 마법이 가능한지도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검색 후 여러 결과를 짜깁기 해야 했던 수고로움 마저도 AI가 가져가고 있다. 이 편함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이런 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내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이따끔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재 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기초체력을 잔뜩 비축 해놓아야한다.
Yellowstone에서 어떻게 얘기까지 왔겠냐 싶지만, 돌아 돌아 얘기하면, 나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온 파트너에게 온전히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가슴 벅찬 자연은 덤이다.
Circle of Life
세계 최초 국립 공원이라는 건 (1872년 제정), 가장 오랜 시간동안 누군가가 이 공간을 지키려 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지키려 했다는 건 다른 의미로 개발을 거의 하지 않고, 자연의 한자처럼 스스로 그러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었다의 의미랑 가까워 보인다. DMZ가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구역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인간 이전에 자연의 모습을 떠올리면, Yellowstone을 떠올릴 것 같다.
물론 불이 나면 끄고, 밀렵을 단속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존의 대원칙은 방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Yellowstone을 보고 들었다. 으레 인간의 조경이나 미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공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더욱 그랬고, 그 느낌은 공원 곳곳에 펼쳐진 집단적 죽음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나무든 동물이든 죽으면 썩어 땅으로 돌아가지만, 여기는 춥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화재와 지열에 말라 죽은 나무들이 대부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GPT에 의하면 길게는 죽어서도 200년을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오히려 공원 곳곳에는 산 나무보다 죽은 나무가 더 많은 곳이 많았다.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햇빛과 벌레에 의해 아주 천천히 침식되는 나무들의 무리. 인간의 죽음은 우리 눈 앞에서 공장적인 과정을 통해 재빠르게 사라지고, 동식물의 죽음은 현대인으로 목격하기 쉽지 않다. Yellowstone에서는 비로소 살아있음만큼이나 죽음 역시 우리 삶을 잔뜩 메우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단순함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정신이 산만할 때 스마트폰의 다재다능성을 탓하곤 한다. 영상도 보다가, 문자가 오면 문자도 하고, 책도 보고, 글도 끄적여 보고…살아가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위를 스마트폰 하나로 영위할 수 있다. 간혹 이 다재다능함이 나에겐 피곤함이 되어 돌아온다.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으니, 왔다갔다 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Yellowstone에 와서 느낀 것이 있다면, 주어진 시간에 내가 정한 하나만 할 수 있다는 단순함의 해방감이다. MP3로 음악만 듣고, 책으로 책만 보고, 지도를 펼쳐 지도만 볼 수 있을 때, 의자에 앉아 멍만 때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기능 하나만을 위해 제품이 갈고 닦아졌을 때 나오는 실용적 간결함과 예술적 경지. 우리는 어쩌면 그 단순함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소프트웨어가 번들링과 언번들링을 지속하듯 LP가 여전히 유행하고, 몰스킨 같은 노트북이 많이 사랑 받는걸 보면, 하나만 잘하는 기기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 같다.
마무리
Yellowstone은 여름 / 가을철에 간다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차로 왠만한 곳을 다 편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공원과의 대부분 시간을 차로만 소통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 나는 그러지 못 했지만, 최대한 많은 액티비티(하이킹, 캠핑, 카야킹, 낚시)를 하며 온 몸으로 느끼길 권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태초의 모습에 가까워 질 수 있을테니!
Leave a comment